초고속 마라맛 전개는 필수

1~2분 정도의 짧은 에피소드의 ‘숏폼 드라마’가 콘텐츠의 미래로 떠오르고 있다. 말 그대로 스마트폰으로 짧은 시간 시청하기 최적화된 콘텐츠다. 이 분야를 선도하고 있는 중국의 국가광전총국은 2020년 숏폼 드라마를 ‘회당 길이가 몇십 초에서 15분 정도, 명확한 주제와 주요 라인을 가지고 연속성과 완결된 스토리 구조를 갖춘 인터넷 시청 프로그램’으로 정의한 바 있다. 스마트폰의 세로형 화면에 맞춰 촬영하다 보니 기존의 영상 작법과는 다른 화면비 문법이 요구되고, 자막도 세로형에 맞는 축약된 형식이 필요하다. 빠른 전개를 위해 등장인물은 극도로 제한되고, 개연성은 포기한다. 인물 감정 표현 중심으로 초고속 마라맛 전개는 필수다.
숏폼 드라마는 중국에서 2년 전 급격하게 떠오르기 시작했다. 작년엔 중국 영화 박스오피스의 70% 수준으로 올라서더니 올해는 아예 넘어섰다. 2027년에는 19조 원 이상의 시장으로 성장할 것이라 전망한다. 글로벌 숏폼 드라마 시장 규모는 2024년 기준으로 13조 원, 한국 시장은 6,500억 원 수준이며 일본의 탑숏이나 동남아시아의 숏티비와 같은 플랫폼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2023년 공개된 <대영박물관 탈출>(대영박물관에 전시된 중국 전통 옥주전자가 사람으로 변신해 박물관에서 탈출한 뒤 우연히 영국에 주재 중인 중국인 기자를 만나 벌어지는 로맨스)과 타임슬립을 가미한 청춘 로맨스물 <내가 17세로 돌아간 이유> 등 눈여겨볼 작품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대표님, 사모님을 잘못 찾으셨어요>, 미국 중년 여성들이 반응한 <억만장자를 낚아채 내 남편 만들기>과 같은 치정 멜로, 백마 탄 왕자 판타지 등을 다루는 로맨스가 주류를 이룬다. 당연히 자극도나 선정성은 기존 드라마보다 높다. 어쩔 수 없이 만난(혹은 하룻밤을 보낸) 남자가 알고 보니 거부, 50세 여주인공이 우연히 연애를 하는데, 그 상대가 알고 보니 어린 재벌남이란 식의 계급 이동과 여성의 판타지에 집중한 플롯이 대부분이다.
 ©대영박물관탈출(逃出大英博物馆)
©대영박물관탈출(逃出大英博物馆)
 ©내가 17세로 돌아간 이유(我回到十七岁的理由)
©내가 17세로 돌아간 이유(我回到十七岁的理由)
중국발
숏폼 드라마의
붐 이유
숏폼 드라마가 뜨거워진 것은 사실 새로움 때문이 아니다. 10여 년 전 원류라 할 수 있는 웹드라마 붐이 일던 시기의 분위기나 작법 면에서는 차이가 크지 않다. 우리의 경우도 <전지적 짝사랑 시점>, <좋좋소> 같은 작품이 사랑을 받았지만 비즈니스 모델을 찾지 못했다. 이후 카카오TV의 <며느라기>, 지난해 넷플릭스의 <닭강정>과 같은 미드폼, 숏폼 드라마에 대한 시도는 꾸준히 이뤄졌지만, 카카오TV는 결국 관련 서비스를 중단하는 등 산업적으로나 대중적으로나 널리 소구되진 않았다.
그런데 최근 중국발 숏폼 드라마가 엄청난 시장을 형성하며 큰 관심을 끄는 이유는 SNS로 콘텐츠 시청 채널이 옮겨가는 생활 흐름과 맞닿아 있다는 점, 그리고 보다 결정적으로 드라마·콘텐츠 산업의 경제성 측면 때문이다. 먼저 콘텐츠 소비자들이 시청한 시간 대비 만족도(가성비)를 중시하는 경향이 강해지면서 정주행의 가치보단 ‘1.5배 재생’, ‘핵심 요약’, ‘결말 포함’ 등 인스턴트 소비가 표준이 되고 있다. 게다가 틱톡이 짧은 동영상(숏폼) 열풍을 일으킨 이후 SNS앱에서 머무르고 콘텐츠를 즐기는 생활이 점점 익숙해지면서, 웹툰을 보는 듯한 스토리와 연출로 빠르게 몰입할 수 있고, 모바일에 최적화된 숏폼도 인기를 끌고 있다는 분석이다.
경제적인 이유는 보다 직접적이다. 숏폼 드라마의 최대 강점은 수익구조(비즈니스 모델)의 유연성에 있다. 제작 기간과 비용은 기성 드라마에 비해 훨씬 짧고 적은데, 판로는 기존 판권 판매, 구독제, 회당 결제 등 다양하고 복합적이다. 예를 들어 <눈물의 여왕>의 경우 10개월 동안 400억 원을 들여 겨우 손익분기점을 넘겼다면, 숏폼의 경우 평균 5,000만~1억 원 정도의 제작비로 50~100화짜리 시리즈를 1~2주면 만들 수 있고, 수익을 올릴 방법은 더 많다는 계산이다. 심지어 영상 보정부터 번역, 음성 더빙과 자막 작업을 넘어 배우까지 AI가 맡아서 하는 시대가 다가옴에 따라 비용과 시간은 기하급수적으로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불황이 한창인 국내 드라마 업계에서 숏폼 드라마를 눈여겨보는 건 어쩌면 당연하다.
 To.엑스 ©나무위키
To.엑스 ©나무위키
 빈대 남편이 알고 보니 대표님 ©숏플렉스
빈대 남편이 알고 보니 대표님 ©숏플렉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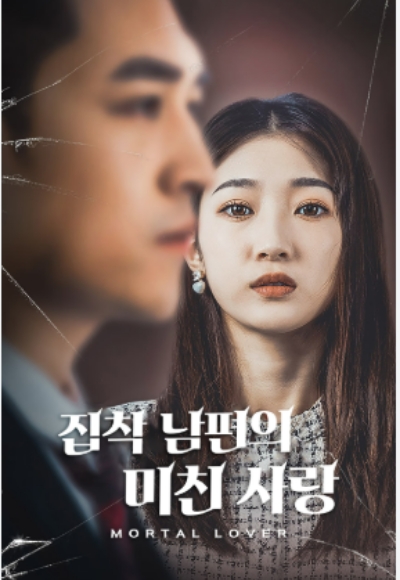 집착 남편의 미친 사랑 ©숏플렉스
집착 남편의 미친 사랑 ©숏플렉스
‘뉴클래식 프로젝트’의 성공
불황 타파의 자구책 중 하나로 과거 드라마나 예능 등 오래된 콘텐츠를 업스케일링하고 재편집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대표적 성공 사례가 19년 만에 다시 세상에 나온 <내 이름은 김삼순>을 비롯한 웨이브의 ‘뉴클래식 프로젝트’다. 테이프로 촬영한 드라마를 4K로 업스케일링해 새로움을 선사하고, 콘텐츠도 숏폼, 숏츠로 소비되는 흐름에 맞춰 16부작을 8부작으로 줄여서 내놓으면서 신규 유료가입 1위를 견인하는 나름의 파장을 일으켰다.
티빙 또한, 지난해에만 160여 개 드라마를 업스케일링하는 등 재활용에 적극적이다. 새로 기획 제작하는 시간과 비용이 없고, 숏폼 드라마의 핵심인 로맨스를 다루고 있으며, SNS에서 입소문을 내기 용이하다는 면에서 숏폼 시대의 핵심인 시성비를 충족시킬 수 있는 토대를 갖추고 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중국발 숏폼 드라마의 열풍과 국내 레트로 무드의 접점이다. 숏츠가 젊은 세대의 전유물이다 보니, 숏폼 드라마도 새로운 세대의 생활양식처럼 보이지만, 현재까지 숏폼 드라마의 주요 타깃층은 구매력과 기존 콘텐츠 경험이 풍부한 중년 여성층이다. 중국발 숏폼 산업의 특징은 기본적으로 유료 서비스이고, 회당 청구를 기본으로 하다 보니, 다른 OTT나 콘텐츠 플랫폼에 비해 소비자의 구매력이 따라야 한다. 최근 중국의 한 조사에서, 숏폼드라마 앱 사용자 중 52.5%가 40세 이상이라는 집계가 나온 바 있고, 한 중국 숏폼 드라마 작가는 “숏폼 드라마의 인기엔 중년 여성의 감정적 욕구가 직접 반영된다”고 인터뷰했다. 국내의 경우도 스푼랩스(비글루)·왓챠(숏차)·폭스미디어(탑릴스) 등 숏폼 드라마 플랫폼 시장을 차지하기 위한 IT콘텐츠 기업들이 출사표를 던지며 Z세대 타깃의 콘텐츠를 내놓았지만 반응은 없었다. 내년을 목표로 준비 중인 이동건, 박하선의 숏폼 로맨스 드라마 <아무짝에 쓸모없는 사랑>은 바로 이 차원에서 눈여겨볼 지점이다.
 ©웨이브
©웨이브
숏폼 드라마는
드라마의 미래가
될 것인가
그렇다면 숏폼 드라마는 우리의 미래가 될 것인가? 관련 이야기와 미래 분석은 너무나 많은데, 가장 활발하게 논의되는 장이 IT산업면이라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전 세계를 아우르는 구체적인 산업 분석과 장밋빛 시장 전망이 천문학적인 액수와 수치의 빅데이터와 함께 쏟아지는데, 드라마의 핵심인 작가·배우·감독에 대한 이야기는 없다. 우린 투자자가 아님에도 여기서 어떤 즐거움과 시대정신을 나눌 수 있다는 경험의 가치 또한 아무도 말하지 않는다.
넷플릿스 예능 <더 인플루언서>에서 국내 톱 인플루언서들조차 숏폼을 단순히 쉽게 돈 버는 것이라고 말해 놀란 적이 있다. 비즈니스 모델이 현실화되었다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긴 하지만 얼마 전 콘텐츠의 미래라고 불렸던 ‘멀티버스’ 열풍을 다시 한 번 보는 것 같기도 하다.
다행히 지금의 ‘막장’ 중국 숏폼 드라마 공식에 매몰되면 안 된다는 이야기가 우리나라 사업자들에게서는 물론, 중국에서도 자성의 목소리로 나오고 있다. 나아가 중국에서는 2040 여성 게이머들을 핵심 이용층으로 분류하면서 게임 문화 및 게임과 접목된 세계관에 대한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대중문화 창작은 시대와의 소통이다. 특히 극화된 영화와 드라마에 몰입하는 것은 작품과 현실의 교류에서 오는 현실을 확장시키는 특별한 즐거움이 있기 때문이다. 숏폼이 하나의 유행 산업으로 지나갈 것인가, 드라마의 다음 패러다임이 될 것인가. 숫자 너머의 이야기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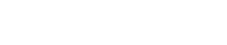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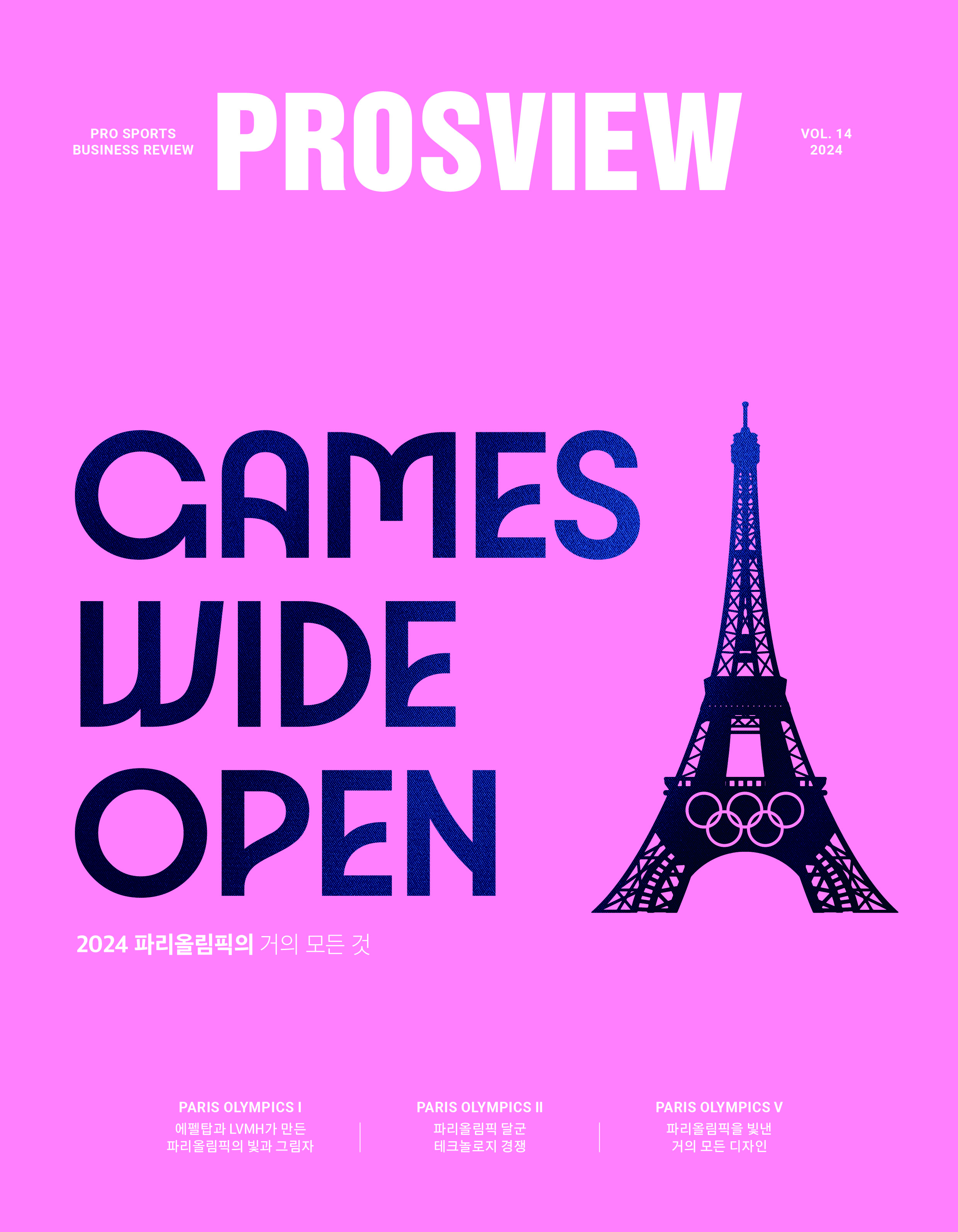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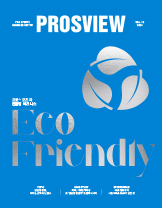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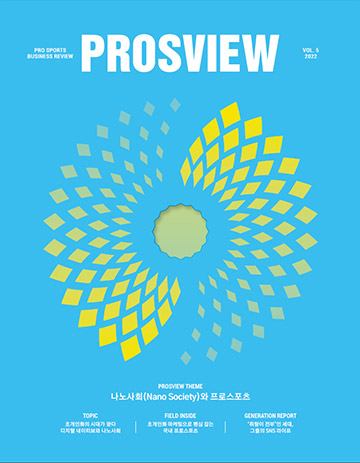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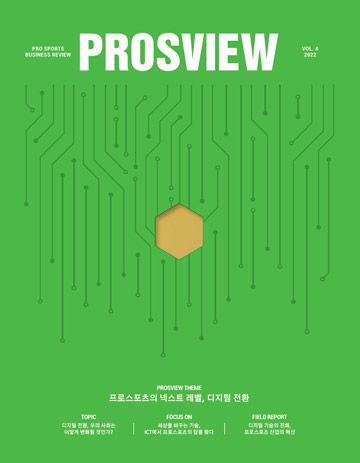





 ©대영박물관탈출(逃出大英博物馆)
©대영박물관탈출(逃出大英博物馆)  ©내가 17세로 돌아간 이유(我回到十七岁的理由)
©내가 17세로 돌아간 이유(我回到十七岁的理由)  To.엑스 ©나무위키
To.엑스 ©나무위키  빈대 남편이 알고 보니 대표님 ©숏플렉스
빈대 남편이 알고 보니 대표님 ©숏플렉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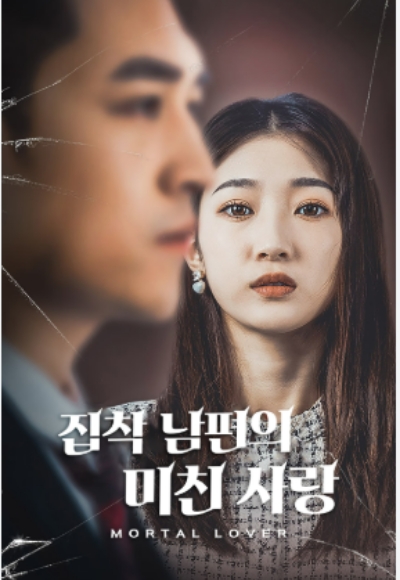 집착 남편의 미친 사랑 ©숏플렉스
집착 남편의 미친 사랑 ©숏플렉스  ©웨이브
©웨이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