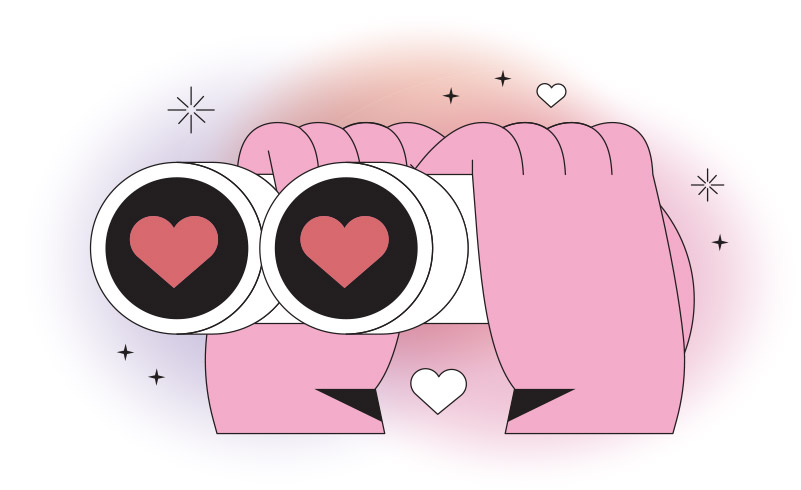홍보 마케팅 분야 전문지 더피알(Then PR) 기자. ‘어렵게 접근해 쉽게 다가가겠다’라는 모토로 소비자의 라이프스타일과 소비스타일에 가장 맞닿아있는 각종 브랜드, 홍보 트렌드, 마케팅 이슈 등 커뮤니케이션 영역을 취재하고 글을 쓴다.

언제부터인가, 거리감이 크게 좁혀진 명품 브랜드와 MZ세대. 명품 브랜드의 높은 가격 정책은 변함이 없지만 일상에서 손에 넣을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해졌고 심지어 가상현실에서도 명품으로 자신만의 개성을 표현하는 시대가 됐다. 이 모든 것은 새로운 소비층으로 급부상한 MZ세대를 공략하기 위한 명품 브랜드들의 치열한 마케팅과 전략에 의해 이뤄진 결과다.


필자는 명품과는 지독히도 관련이 없는 밀레니얼 세대의 사람이다. 너무 비싼 가격대일뿐더러 범접할 수 없는 아우라가 느껴진달까. 언감생심의 대명사라 생각하며 애초부터 구매할 생각일랑 하지 않았다.
다만 ‘돈이 없다’는 구차한 이유로 일축하기에는 조금 억울한 측면도 있다. 명품 또한 나를 쳐다봐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애초부터 구매할 가능성이 없는 부류에 차갑게 대하며 고급화 전략을 펼치던 게 명품 아닌가. 관심 없기는 피차일반이며, 그렇기에 서로가 서로에게 무관심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쭉 해왔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명품이 나를, 그리고 명품을 꿈꾸지 못했던 MZ세대를 바라봐주기 시작했다. 언젠가는 명품을 구매할 수도 있다며 잠재 고객인 MZ세대에게 지속적으로 손을 내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자존심이 있지, 이제 와 구애한다고 한들 넘어가겠냐 생각한 것도 잠시. 방법이 지지부진했다면 소용없다며 고개를 돌렸을 수도 있지만 아주 독특하고 신선하며 혁신적인 마케팅 및 커뮤니케이션으로 MZ세대의 흥미를 끌고 있다. 안 보고 싶어도 워낙 재미있어 보이니 눈길이 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명품이 MZ세대를 위해 준비한 다양한 무대들을 경험하니, ‘나도 명품 한 번 구매해볼까?’라는 생각이 드는 건 당연지사다.
이는 비단 필자만의 경험은 아닐 것이다. 많은 MZ세대에 속하는 사람들이 최근 명품 브랜드들의 행보를 보며 느끼는 감정이 아닐까 싶다. 그런데 근본적인 의문이 든다. 콧대 높던 명품은 갑자기 왜 MZ세대를 잡기 위해 혈안이 된 걸까. 물론 생로를 모색하기 위함이 크다. 하도 고급화 전략을 펼치다 보니 브랜드의 소비층이 한정될 수밖에 없다. 새로운 소비자를 계속해서 유입해야 브랜드 역시 살아남을 수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고여버리니 브랜드 자체도 노후화되어버린 것이다.
그렇게 위기에 봉착한 명품 브랜드들이 택한 방법이 바로 젊어지고, 젊은 잠재 고객을 타깃으로 삼아 이들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는 것이다. 또 MZ세대는 소신을 갖고 사회에 대한 책임의식도 뚜렷하며 진보적이기에 기존 럭셔리 브랜드가 주창하던 소비력, 과시, 사회적 지위만으로는 이들을 설득할 수 없으니 변화를 꾀할 수밖에 없다.
이렇듯 꾸준히 새로운 타깃에게 어필해온 결과, 이들의 노력은 빛을 발하기 시작한다. 물론 아닌 사람도 여전히 존재하나 이전보다 많은 사람이 명품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친숙한, 그리고 나도 착용해볼 수 있는 제품으로 새롭게 포지셔닝하자 코로나 속 불황이란 단어를 모르는 소비재 중 하나로 우뚝 서게 됐다. 시도 때도 없이 가격을 올려도 계속 팔리고, ‘보복 소비’라는 말의 당당한 주체가 되며 끊임없이 소구되고 있는 형국이다.
그렇다면 명품 브랜드는 도대체 어떤 다양한 접근을 시도했기에 팬데믹 상황에서도 르네상스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일까. 그 전략들을 살펴본다.
그동안 우리가 명품을 만날 수 있었던 루트는 아주 한정적이었다. 백화점 명품관, 면세점 등이 전부였다. 혹은 해외에 나가서 구매하면 좀 더 싼 값에 구할 수 있는 게 명품이기도 했다. 무엇이 됐든 구매할 수 있는 경로가 아주 불친절했다는 건 부정할 수 없다.
하지만 요즘에는 조금 과장해서 말해 명품이 지천에 깔린 상황이다.
명품을 구할 수 있는 채널이 매우 많아진 것이다. 머스트잇, 트렌비, 발란 등의 온라인 명품 플랫폼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는 것은 물론 자주 사용하는 서비스인 ‘카카오톡 선물하기’에서도 명품을 구매할 수 있다. ‘1년 동안 고생한 나를 위한 명품 목걸이’를 직접 어딘가에 가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모바일로 바로 선물해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편의점에서도 명품을 구매할 수 있다. GS25 파르나스타워점의 매대에는 명품이 진열돼 있기도 했다.
직접 구매하지 않아도 명품을 시도할 수 있다. 바로 렌탈을 통해서다. MZ세대는 명품을 통해 부를 과시하기보다는 자기표현의 수단으로 여기기도 하기에, 합리적으로 명품을 경험한다는 측면에서 렌트 서비스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또 무인 중고명품 자판기까지 등장하는 등 그렇게 어렵지 않게 다양한 채널에서 명품을 구하는 트렌드가 널리 퍼지고 있다.
여기에 과시나 자기표현 외에 또 다른 개념으로 명품을 소비할 수 있는 방법인 ‘리셀’이 등장하며 명품은 더욱 존재감을 확산한다. 지금 제값에 구매해 나중에 더 높은 가격으로 팔려는 것이다. 이렇듯 투자의 대명사로도 자리 잡으며 명품은 그 어느 때보다 호황을 맞이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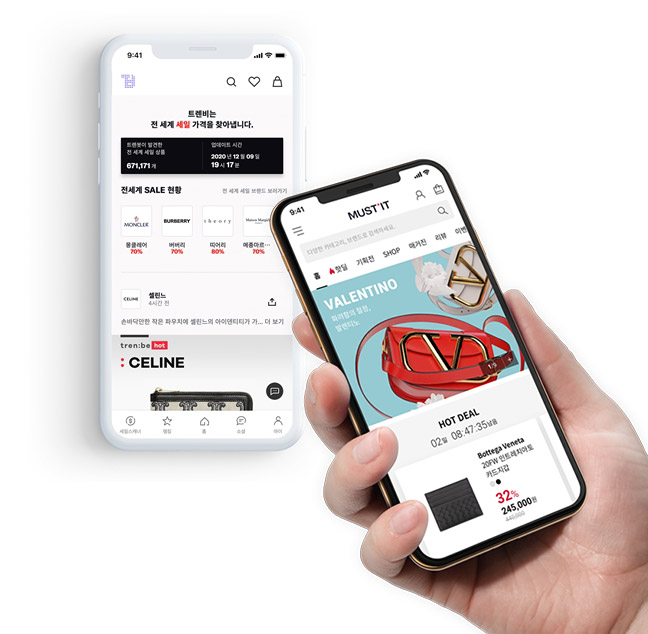 트렌비 모바일 화면 ©싱글리스트
트렌비 모바일 화면 ©싱글리스트
머스트잇 모바일 화면 ©머스트잇 홈페이지
물론 판매 채널을 늘리고 접근성을 낮추는 것이 다는 아니다. 이는 명품업계가 MZ와 친해지기 위해 하는 노력의 아주 일부에 불과하다.
명품업계는 젊은 친구들의 눈에 들기 위해 다양한 마케팅 및 크리에이티브를 발현하고 있다.
그리고 그 노력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콜라보레이션(이하 콜라보)’이다. MZ세대에게 원래 인기가 많던 브랜드들과 끊임없이 협업하며 자사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이다. 가령 구찌는 노스페이스와 협업하며 명품성과 실용성이 가미된 제품을 선보였다. 해당 협업은 만남 자체로도 큰 화제를 모았지만, 특히 두 가지 측면에서 MZ세대들이 열광할 지점이 있었다. 우선 디자인의 경우 70년대를 표방해 뉴트로를 좋아하는 MZ세대에게 소구될 수 있었다. 또 폐기된 카페트에서 나온 재생 재료를 사용한 가방, 코팅 처리가 되지 않은 재활용 가능한 종이를 사용한 포장재 등 친환경 제품을 선보이며 윤리적 가치 소비를 행하는 이들에게 큰 귀감이 됐다.
그 밖에도 모스키노는 켈로그 시리얼의 캐릭터로 유명한 ‘토니 더 타이거’와 협업해 컬렉션을 선보였고, 로에베는 스튜디오 지브리와 콜라보했다. 루이비통은 레고와 손잡고 브랜드 창립자 탄생 200주년 기념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등 명품과 힙한 브랜드 간의 다양한 콜라보가 나타나고 있다.
한편 이런 콜라보는 ‘리셀’ 트렌드로 이어지기도 한다. 명품과 힙한 브랜드가 만났고, 발매하는 수량은 한정돼 있으니 이를 얻기 위해 피 튀기는 경쟁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하다. 일례로 명품 브랜드 디올과 나이키가 협업한 ‘에어 조던 1 OG 디올 리미티드 에디션’의 판매가는 300만 원이었으며 리셀가는 최소 1,500만 원으로 형성되기도 했다.
 구찌와 미키마우스 캐릭터의 콜라보 ©럭셔리 포유
구찌와 미키마우스 캐릭터의 콜라보 ©럭셔리 포유
 (위)로에베와 지브리 캐릭터의 콜라보 ©로에베 홈페이지
(위)로에베와 지브리 캐릭터의 콜라보 ©로에베 홈페이지
(아래)루이비통의 콜라보 ©네이버 포스트
 ‘구찌 가옥’ 플래그십스토어 ©조선비즈
‘구찌 가옥’ 플래그십스토어 ©조선비즈
 샤넬 아이스링크장 ©롯데백화점
샤넬 아이스링크장 ©롯데백화점
명품 브랜드의 크리에이티비티 발현은 ‘공간’을 통해서도 나타난다. 명확한 콘셉트를 가진 팝업스토어 및 플래그십스토어를 만들어 젊은 소비자들을 모객하는 것이다. 구찌의 경우 최근 ‘구찌 가옥’이란 플래그십스토어를 통해 한국의 고유함을 담은 매장을 선보였다. 오직 구찌 가옥에서만 판매하는 색동저고리에서 착안한 제품들을 선보인 것은 물론, 매장 인테리어 역시 한국의 정취가 담겨있다. 올해 상반기에는 구찌 가옥 내 오스테리아 레스토랑을 열 것이라 밝혀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샤넬은 최근 잠실에 아이스링크장을 선보인 바 있다. 샤넬의 아이코닉 향수 N°5의 100주년을 기념한 공간이다. 명품 브랜드와 아이스링크라는 상상할 수 없는 조합에 많은 이들이 해당 공간을 방문했다. 샤넬은 이전에도 100주년을 맞아 성수동에 샤넬 팩토리를 오픈하는 등 공간 경험에 힘쓰는 모습을 꾸준히 보이고 있다.
까르띠에는 일본에 편의점을 만들어 큰 충격을 안기기도 했다. 저스트 엥 끌루라는 제품을 홍보하기 위해 만든 공간인데, 구하기 어렵기로 소문난 유명 브랜드들의 디저트와 홍차, 금가루가 붙어있는 아이스바, 캐비어 아이스크림 등 평소에는 접할 수 없는 제품들을 판매했다. 또 신문 매대에는 저스트 엥 끌루의 홍보물을 끼워 넣는 등 자연스러운 홍보도 잊지 않았다. 이 파격적인 만남은 SNS를 통해 널리 공유되며 일본 내 2030세대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그밖에도 버버리는 카페를 만들고, 베트멍은 F&B 사업에 진출해 햄버거를 판매하는 등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공간을 꾸며내며 청년들의 입소문을 자아내고 있다.
그리고 이들의 공간 활용은 오프라인에서 그치지 않는다. 온라인 공간, 특히 최근 성행하고 있는 메타버스 역시 명품 브랜드들의 무대가 된다. 이를 가장 잘 활용하고 있는 브랜드가 구찌다. 구찌는 대표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일컬어지는 제페토에 맵을 론칭하며 다양한 구찌 IP를 선보이고, 이용자들의 아바타가 직접 입어볼 수 있게 했다. 또 로블록스에는 ‘구찌 가든’을 만들었다. 한정판 가상 아이템과 가상 매장을 선보였는데, 여기서 출시된 메타버스 한정판 제품 ‘구찌 퀸 비 디오니소스’의 경우를 주목할 만하다. 공식 출시 당시 약 475로벅스(로블록스 내 이용하는 화폐), 즉 약 6달러 정도에 팔렸었지만, 이후 유저들 사이에서 700배 이상 상승한 가격인 35만 로벅스에 되팔린 것이다. 또 불가리는 자체 메타버스 플랫폼을 만들어 전시회를 선보이기도 했다. 직접 제작한 게임 속에 브랜드를 적절히 녹여내 커뮤니케이션하는 애드버게이밍(Advergaming)도 빼놓을 수 없다. 버버리는 재작년 홈페이지에 온라인 게임 ‘비서프(B-Surf)’를 공개했다. 서핑을 통해 전 세계 유저들과 경쟁하는 레이싱 게임이다. 버버리는 플레이하기 전 가상 플레이어들이 입는 옷과 서핑보드에 자사 제품을 썼다. 앞서 출시한 ‘비바운스(B-Bounce)’ 게임 역시 버버리의 의상을 입고 게임을 즐길 수 있다.
구찌도 게임 마케팅이 한창이다. 구찌 모바일 앱에는 레트로 게임 ‘구찌 아케이트’, 구찌가 자주 사용하는 벌을 미로에서 탈출시켜주는 ‘구찌 비’ 등을 포함해 9개의 게임이 마련돼 있다. 루이비통 역시 ‘엔드리스 러너’라는 레트로 게임을 내놓았다. 에르메스는 ‘H피치’라는 브랜드 게임을 플레이하면 독점 콘텐츠를 시청할 수 있도록 한다.
루이비통은 ‘루이 더 게임(Louis the Game)’을 출시했는데, 마스코트 비비엔이 200개의 모노그램 초를 찾아 세계의 6개 지역을 모험하며 루이비통의 상징적인 순간들을 밝혀내고, 생일 축제가 열리는 목적지에 다다른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리고 이 루이비통의 사례에는 한 가지 더 주목해야 할 점이 있는데, 바로 요즘 유행하는 NFT(대체불가토큰, Non Fungible Token)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스테이지나 퀘스트를 완수할 때마다 총 30개의 NFT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또 마크제이콥스, 발렌티노 등은 게임 ‘모여봐요 동물의 숲’을 통해 2020 SS(Spring Summer), PF(Pre Fall) 컬렉션 의류를 공개했다. 코로나19로 패션쇼를 열기 어려워지자, 동물의 숲 게임 속 공간에서 패션쇼를 열기도 했다.
 버버리 온라인 게임
버버리 온라인 게임
‘비서프(B-Surf)’ 캐릭터 ©bagaholicboy
 에르메스 ‘H피치’ 브랜드 게임 ©popbee
에르메스 ‘H피치’ 브랜드 게임 ©popbee
그밖에도 최근 가치 소비, 윤리적 소비 등의 트렌드가 MZ세대에게 대두되며 명품 브랜드 역시 이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인다. 많은 브랜드가 업사이클링 제품을 만들며 친환경 흐름을 타는 가운데 에르메스는 버섯균사체 배양가죽으로 만든 ‘빅토리아 백’을 선보였고, 아르마니의 경우 ‘앙고라 모직’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또 젠더뉴트럴, 에이지뉴트럴 등 세대와 성별을 구분 짓지 않는 명품 브랜드들의 움직임에 많은 이들이 열광하기도 한다.
이렇듯 다양한 혁신적인 전략을 통해 명품 브랜드는 사람들, 특히 MZ세대의 시선을 끌고 있다. 하지만 너무 MZ에만 치중해 원래 고객을 잃는 것은 아닐지 점검해보는 것도 필요하다.
주얼리 브랜드 티파니는 최근 ‘NOT YOUR MOTHER’S TIFFANY(너희 엄마의 티파니가 아니다)’라는 캠페인을 선보인 바 있다. 이들의 클래식한 이미지를 탈피하고 트렌디한 매력을 전달하고자 한 것인데, 이는 기존 고객은 물론 이들이 타깃한 젊은 세대들에게도 외면 받았다. ‘왜 모두의 티파니는 될 수 없나’는 반응도 있었다고 한다. 이렇듯 티파니와 달리 너무 하나에만 천착해 전체를 보지 않는 모습을 경계하는 것 역시 명품 브랜드가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르네상스를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아닐까 싶다.